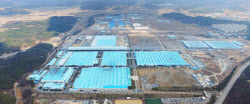[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일본 릿쿄대학 경제학부 교수이자 “한국과 일본이 만나는 곳에 언제나 서 있는 경계인”인 저자가 일제강점기 일본과 조선의 음식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살폈다. 식민지 조선을 둘러싸고 일제가 조선에서 단행한 ‘식’(食)의 재편이 어떻게 양국의 음식문화를 바꾸어놓았는지를 조명하고, 식민지 통치에서 음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헤쳤다.
저자의 연구 중심엔 ‘푸드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다. ‘푸드 시스템’은 “식료의 생산부터 유통·가공을 거쳐 소비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식민지 시기에 대한 기존 경제사 연구는 쌀이나 일부 식량에 한정돼 있었다. 저자는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쌀, 소, 홍삼, 우유, 사과, 명란젓, 소주, 맥주, 담배 등의 경제사 및 산업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푸드 시스템’의 형성이 일본 제국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반이었음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다.
저자의 연구는 식민지 시대에 식문화도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을 잘 보여준다. 조선 쌀이 일본에 수출되면서 조선인의 칼로리 섭취에 변화가 생겼고, 홍삼으로 가공된 조선 인삼은 조선 총독부 재정에 기여했다. 함경도 지역의 음식이었던 명란젓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의 기호품이 되고 상품화됐다. 술과 담배 또한 식민지 재정과 조선인의 식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번역자인 임경택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옮긴이의 말’에서 “실증경제학자다운 치밀한 수량 분석에 기초하여 고찰한 역사 연구서”이며 “근대화론과 수탈론, 시장과 정책의 분석, 경제와 문화의 고찰을 균형 있게 짜낸 이 책은 분명 일제강점기 조선의 음식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서”라고 소개했다.










![[포토]서울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추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1121t.jpg)
![[포토]화재진압 훈련하는 종로구 소방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1083t.jpg)
![[포토]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1019t.jpg)
![[포토]평생당원 초청 간담회 참석하는 한동훈 당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858t.jpg)
![[포토] 세계최초 8K 온디바이스 AI TV](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97t.jpg)
![[포토]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투명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57t.jpg)
![[포토]패딩이 필요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47t.jpg)
![[포토]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37t.jpg)
![[포토] 훈련장 이동하는 '시니어 아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1152t.jpg)
![[포토] 오세훈 시장과 김병주 MBK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960t.jpg)
![[포토] 롯데 챔피언십 공식 포토콜 단체사진](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107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