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금융 F&I가 부실채권 1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추가 입찰에 NPL(부실채권 관리회사)업체가 나설지는 미지수다. 은행권에서 담보가 있는 NPL 2조원어치를 조만간 쏟아낼 예정인데다, 무담보 채권은 강한 추심을 할 수 없도록 금융당국이 규제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은 지난달 29일 실시한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 자산유동화 방식 공동 매각’ 최종 입찰 결과 단독 참여한 우리F&I 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19개 저축은행과 각각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12개 저축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최종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7개사(부실채권 200억원 규모)는 우리F&I에 매각을 포기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매각가율은 기존 캠코 매각 가격의 약 130%로 인상된 수준”이라며 “종전 캠코 매각에 한정돼 있던 개인 무담보 부실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마련했다”고 했다. 캠코가 매입한 가격은 대출 원가의 30~50%였다. 여기에서 30% 인상됐다면 대략 원가의 65%로 시장가보다는 낮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NPL 회사 관계자는 “NPL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담보 채권을 사와 매각한다”며 “그러다 보니 (무담보 채권) 사업성 평가 방법 등 준비가 안 돼 있어 선뜻 손대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잘 알지 못하는’ 무담보 채권보단 본업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NPL 회사 관계자도 “불법 추심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담보 채권에 대해 추심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 NPL 회사가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접 컨트롤하지 않는 추심 활동 자체가 부담이라는 뜻이다.
수익성 관점에서 무담보 채권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단 해석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캠코가 팔았던 가격을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를 최저 입찰 가격으로 준 건데 그 가격으로 사와 수익을 낼 수 없어 입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저축은행 업계는 향후 공동 매각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6.01%로 6월말(5.65)보다 0.36% 오른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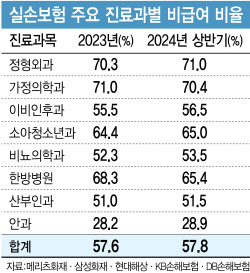




![[포토]마다솜,통산 4승 만들어준 넘버원 볼](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100280t.jpg)
![[포토]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 '모두발언하는 한동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100253t.jpg)
![[포토] 소방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큰 불 신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360t.jpg)
![[포토] 이대한 '2024시즌 대미를 장식하며 동료들과 함께'](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314t.jpg)
![[포토]의협 대의원총회 참석하는 임현택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95t.jpg)
![[포토]잠시 쉬어가는 서울야외도서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81t.jpg)
![[포토]‘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숙박·놀이공원·학습지 등 신규 참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59t.jpg)
![[포토]정부, ‘비위 혐의 다수 발견’ 이기흥 체육회장 등 경찰 수사 의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27t.jpg)
![[포토]수능대박을 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02t.jpg)
![[포토]가을의 추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165t.jpg)
![[포토]마다솜,저의 볼 마크입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1100281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