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기로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내년 경제 전망이 정말 심각하다”며 “기업들은 현금을 확보하고 신규 투자와 채용을 줄이는 비상경영 체제를 택할 수밖에 없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에 따른 기업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과 투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감원과 구조조정이 주요 기업에서 포착되고 있고 내년 신규 채용 계획도 많이 줄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의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내년 투자를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기업이 등장하는 등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가 줄면 고용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론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결국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투자처로서 갖는 매력까지 끌어내릴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법인세는 여전히 최고세율이 24%인데다 누진세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한 뒤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상황에서 세액 공제가 적은 단점을 보완할 요소가 없다면 굳이 투자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요 산업만이라도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정식 교수는 “정치적 이유들로 법을 통과시켜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배터리·바이오·이차전지, 군수산업 등 육성 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른 방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수를 안정시키고 경기가 연착륙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수출 업종과 바이오·전기차 등 기술 투자가 많은 업종에 한해서는 세액공제 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반도체 장비 등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수출·R&D 관련 세액공제가 미비한데 이를 계속 늘리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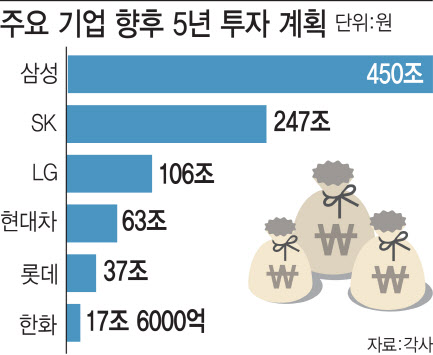





![[포토] 송민혁 '우승과 함께 신인왕을 노린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474t.jpg)
![[포토] 화사, 매력적인 자신감](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93t.jpg)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10억 벌었다? 자칫 다 날릴 수도"…'잠실 로또' 당첨 주의점은?[떳다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1085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