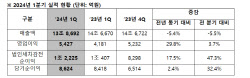|
돈의 사용 가격인 (시장)금리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값에 채무자의 위험부담비용(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지기 때문에 신용도에 따라 금리부담이 달라진다. 만약, 금융시장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어져 누구에게나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면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마찬가지로 가치평가 방법이 완벽해져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주가가 고정되면서 주식거래가 한산해지고 기업자금조달기능이 저하된다.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고정된다면 자국 화폐의 대외가치 평가가 어려워져 대외 위험과 불확실성에 시장 스스로 적응하기 어려워진다. 투자자들의 판단이 엇갈려야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활력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커간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정부의 암묵적 통제 아래 금융안정 명목으로 갖가지 대출제한 조건이 붙고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금리와 대출규모를 정하는 그레이마켓(gray market)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가격기능이 제한되어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환경이 전개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다 2022년 대선에서 경제적 형편이 나쁜 가계가 형편이 좋은 가계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신용이 높거나 낮거나 균등한 금리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지불불능위험 크기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높낮이를 없애 저소득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뜻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회를 향해 노력해야 하는데, 다 똑같이 잘사는 사회를 표상하다가 자칫 다 같이 못살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시장에 보이는 손(visible hand)이 개입하면 가격기능이 훼손되어 경쟁질서가 흩어지고 ‘일물일가 법칙(law of indifference)’이 흐릿해져 이중가격, 삼중가격이 발생할 위험이 도사린다. 공동체 구성원 간에 신용질서 확립과 신뢰기반 구축은 사회적 적응능력을 부지불식간에 배양하여 경제성장과 발전의 요체인 성장잠재력 확충도 진행된다. 사회주의, 포퓰리즘 국가들처럼 경쟁 없는 사회는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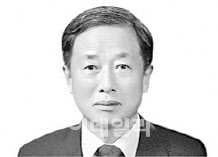





![[포토]김희지 '핀 주변을 살핀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0654t.jpg)
![[포토]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금융투자 부분 수상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1046t.jpg)
![[포토]'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이준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0759t.jpg)
![[포토]쾌적한 비행을 위해 봄맞이 세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0578t.jpg)
![[포토] '법의 날' 축사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0502t.jpg)
![[포토]'기자회견 기다리는 황운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0358t.jpg)
![[포토]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하는 홍익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0272t.jpg)

![[포토]이주호 사회부총리,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학생·교수 복귀 총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400781t.jpg)
![[포토]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영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400618t.jpg)
![[포토] 신용구 '정교한 샷으로 선두권에 진입'](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600096t.jpg)